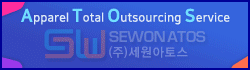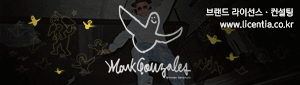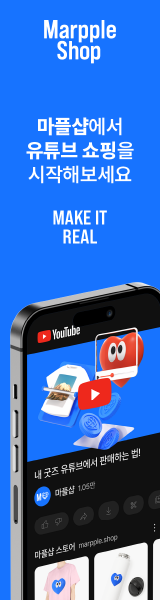
판매의 달인, 2013년 소비자를 말한다
브랜드 충성도·세일 효과·단골 실종
발행 2013년 10월 01일
박선희기자 , sunh@apparelnews.co.kr
■ 판매의 달인, 2013년 소비자를 말한다
브랜드 충성도·세일 효과·단골 실종
현장 판매 전문가들에게 오늘의 소비자에 대해 물었다. 백화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경력의 숍 매니저들은 ‘브랜드 충성도’, ‘세일 효과’, ‘단골 고객’ 이 세 가지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상품과 신뢰 구축에 주력해 주기를 주문했다. 하루 열 시간 이상을 소비자들과 대면하며 살아 온 이들은 지금의 소비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 격세지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
한선미희 매니저(‘띠어리’ 신세계 강남점) “트렌드가 아닌,
백화점 고가 여성복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의 고객이 90%의 매출을 차지한다. 다만 그 10%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패턴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고객은 언제나 존재해 왔는데, 그들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스타일에 있어 나이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
|
김순영 매니저(‘톰보이’ 신세계 본점) “백화점 고객은
과거에는 정으로 매장을 찾는 단골 고객들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실속형 소비자다. 과거 소비자들이 매장의 권유나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매장을 찾는다.
| ||||||
|
최선자 매니저(‘시슬리’ 현대 무역센터점) “세일은 본래의
90년대 초중반 ‘톰보이’가 세일을 시작하는 첫날이면 백화점 문 앞에서 개장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줄을 선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불과 20년 만에 바뀐 풍경은 말 그대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 ||||||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1 해외 정통 아웃도어, 한국 시장 잇달아 진출
- 2 서울 및 수도권 35개 백화점 여성캐릭터캐주얼 매출
- 3 무신사 스탠다드, '스타필드 수원' 1주일 매출 3.3억원
- 4 박인동 당당 대표 장남 화촉
- 5 에뜨와, 친환경 리유저블백 증정 프로모션 진행
- 6 가두 볼륨 여성복의 희비…인동·신원·세정 '선방'
- 7 이랜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영 속도
- 8 페어라이어, 일본을 들썩이다
- 9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예루살렘 샌들과 협업
- 10 ‘K2’의 프로덕트 전략, 연이어 히트
- 11 맨발로 시작한 스포츠 슈즈 ‘밸롭’, 올해 450억 내다본다
- 12 핵심 상권 주간 리포트
- 13 휠라, 신개념 테니스 축제 ‘2024 화이트오픈 서울’ 개최
- 14 챌린저, ‘골프를 위한 패션’ 리뉴얼 후 30% 성장
- 15 에스제이그룹, ‘올해부터가 본 게임’
- 16 ‘와릿이즌’ 카테고리 다각화
- 17 패션 중견사, 자사몰 육성 속도 낸다
- 18 극강의 체온조절 소재 ‘아웃라스트’ 한국 상륙
- 19 오픈런프로젝트, 1분기 매출 20% 증가
- 20 美 연방거래위원회,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 저지 검토
구인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