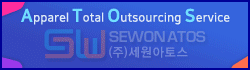고태용의 ‘패션 디자이너의 세계’
디자이너로 살면서 매 시즌 컬렉션을 발표할 때마다, 종종 이건 영감(inspiration)인가, 아니면 카피(copy)인가? 하는 민감한 질문 앞에 선다.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질문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창작의 영역은 본질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대화이며, 타인의 결과물 위에서 새로움을 쌓아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계는 매우 흐릿하다. 최근 젠틀몬스터와 블루엘리펀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은 이 문턱을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냈다. 젠틀몬스터는 블루엘리펀트가 자사의 안경·파우치 디자인과 매장 인테리어까지 95~99%의 유사성을 보인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되짚어야 할 질문은 단지 “법적으로 보호받는가”가 아니다. 디자인 모방과 영감은 어떻게 구분되며, 그 사이에 어떤 미묘한 윤리적 기준, 그리고 창작자의 존엄이 존재하는가이다.
패션에서 카피는 흔히 원본의 시각적 요소를 거의 같게 모사하는 행위다. 반대로 오마주는 특정 디자이너나 작품에 대한 경의를 담되, 새로운 해석이나 맥락을 부여하는 창조적 행위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법과 미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 특히 패션처럼 ‘기능적 우선’ 범주에 속하는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가 어렵고, 트렌드 기반으로 유사한 결과물이 반복 등장하기 쉬운 구조다.
이런 맥락에서 패션계에는 듀프(dupe)라 불리는 유사 상품 문화가 자리 잡았다. 듀프는 고가의 명품이나 인기 제품과 비슷하나 가격은 훨씬 저렴한 대체품을 구매하는 소비 행위다. 듀프 상품들은 상표 로고를 모방하지 않더라도 원본과 큰 외관적 유사성을 가지면서 저렴하게 시장에 등장해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듀프는 법적으로도 애매한 지점에 놓인다. 로고 자체를 훔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원본과 너무 닮아 소비자의 혼동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는 단순해지지 않는다.
이번 젠틀몬스터 사례에서 젠틀몬스터 측이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오마주는 결코 단순한 모사나 빌려 쓰기와 같지 않다. 좋은 오마주는 원작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묘사를 만들어 낸다. 이를테면 과거 클래식한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 비율로 재해석하는 것처럼 말이다.
반면, 법과 미학의 경계선 너머 ‘거의 똑같은‘ 수준은 오마주가 아니다. 이것은 창작자의 오랜 노력과 문제의식을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을 베껴오는 행위에 가깝다.
물론 디자인의 역사 자체가 끊임없는 참조와 재해석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창작자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 브랜드 아이덴티티, 맥락적 해석까지 포함된 창작물은 단순 모사의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번 소송은 단지 한 브랜드와 또 다른 브랜드의 갈등을 넘어, 한국 패션 산업이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진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존중받아야 할 창작으로 보고, 어디서부터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정 행위로 규정할 것인가.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 질문은 더 무거워진다. 빠른 상품 회전, 치열한 경쟁, 트렌드의 가속화 속에서 ‘조금 닮아도 괜찮다’는 자기합리화는 언제든 등장한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브랜드는 더 이상 창작자가 아닌 모방을 계산하는 기획자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논쟁의 마지막 판단자가 사실은 소비자라는 것이다. 비슷해 보이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소비는 ‘이 브랜드의 태도, 철학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조용한 거절을 표한다.
법정 판결과 별개로 브랜드의 신뢰도와 존속은 결국 시장에서,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에서 결정된다.
안타깝지만 이런 논쟁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자주, 더 빠르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지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복제되는 시대, 트렌드가 하루 만에 확산되는 구조 속에서 카피와 오마주의 경계는 점점 더 흐려질 것이다.
그렇기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제도보다 태도다. 모두가 비슷해질수록, 무엇을 베끼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켜냈는가가 브랜드의 얼굴이 된다. 창작자의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가장 또렷하게 남는다.
결국 이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카피인가, 오마주인가. 그 대답은 법원이 아니라, 창작자 자신과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
| 고태용 비욘드클로젯 대표 |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