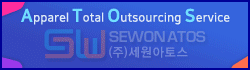мҳӨ진нғқмқҳ ‘섬мң мқҳ лҜјмЎұ’
 |
| кҙ‘л¶ҖмҷҖ лҶҚл¶Җл“Өмқҳ мһ‘м—…ліөмқҙлҚҳ мІӯл°”м§Җ |
60~90л…„лҢҖ мқёлҘҳмӮ¬м—җ мқјм–ҙлӮң нҢЁм…ҳ нҳҒлӘ…мқҖ мӮ¬мӢӨ 섬мң нҳҒлӘ…мқҙлқј н•ҙлҸ„ кіјм–ёмқҙ м•„лӢҲлӢӨ. мқҙ мӢңкё° нҢЁм…ҳмқҖ лӢЁмҲңн•ң мҳ· мқҙмғҒмқҳ кІғмқҙм—ҲлӢӨ. мӮ¬нҡҢлҘј л°”кҫёлҠ” мҷём№Ёмқҙм—Ҳкі , м„ёлҢҖмқҳ м •мӢ мқ„ л“ңлҹ¬лӮҙлҠ” ‘비주얼 м„ м–ё’мқҙм—ҲлӢӨ. мҡ°лҰ¬лҠ” мў…мў… л””мһҗмқҙл„ҲлӮҳ мң лӘ… мқёл¬ј, нҳ№мқҖ л¬ёнҷ”м Ғ 분мң„кё°лҘј мӨ‘мӢ¬мңјлЎң к·ё мӢңкё°лҘј м„ӨлӘ…н•ҳм§Җл§Ң, м •мһ‘ кІ°м •м Ғ мҳҒн–Ҙмқ„ лҒјм№ң ‘진м§ң мЈјмқёкіө’мқҖ л”°лЎң мһҲлӢӨ. л°”лЎң мӣҗлӢЁ, мҰү ‘섬мң ’лӢӨ.
кё°мҲ мқҙ л§Ңл“ м§Ғл¬ј, к·ёлҰ¬кі м§Ғл¬јмқҙ л§Ңл“ л¬ёнҷ”. 60~90л…„лҢҖмқҳ нҢЁм…ҳ нҳҒлӘ…мқҖ мӢӨмқҖ ‘мғҲлЎңмҡҙ мҶҢмһ¬мқҳ нғ„мғқкіј ліҙкёү’мқҙ л§Ңл“Өм–ҙлӮё мӮ°л¬јмқҙм—ҲлӢӨ. к°Ғ мӢңлҢҖлҘј лҢҖн‘ңн•ң мҳ· л’Өм—җлҠ” м–ём ңлӮҳ к·ёлҘј к°ҖлҠҘн•ҳкІҢ л§Ңл“ мғҲлЎңмҡҙ мӣҗлӢЁмқҳ нғ„мғқмқҙ мҲЁм–ҙ мһҲлӢӨ. к·ёмӨ‘ лӘҮ к°Җм§ҖлҠ” мӢ¬м§Җм–ҙ м •м№ҳмҷҖ кІҪм ңлҘј мӣҖм§Ғмқҙкё°лҸ„ н–ҲлӢӨ.
1960л…„лҢҖ кіјн•ҷмқҙ лӮімқҖ лӮҳмқјлЎ кіј нҸҙлҰ¬м—җмҠӨн„°
мҡ°мЈј кІҪмҹҒмқҙ н•ңм°ҪмқҙлҚҳ 60л…„лҢҖ, кіјн•ҷмқҖ мӮ¬лһҢмқ„ лӢ¬м—җ ліҙлӮҙлҠ” кІғ мҷём—җлҸ„ нҢЁм…ҳкі„лҘј мҶЎл‘җлҰ¬м§ё нқ”л“Өм–ҙлҶ“м•ҳлӢӨ. лҜёкөӯ л“ҖнҸ°мӮ¬(DuPont)к°Җ к°ңл°ңн•ң лӮҳмқјлЎ кіј нҸҙлҰ¬м—җмҠӨн„° к°ҷмқҖ н•©м„ұ 섬мң лҠ” к°ҖліҚкі , кө¬к№Җмқҙ м—Ҷмңјл©°, л¬ҙм—ҮліҙлӢӨ мӢёкі , л№ЁлҰ¬ мғқмӮ°н• мҲҳ мһҲм—ҲлӢӨ.
мқҙлҹ¬н•ң 섬мң л“ӨмқҖ лӢ№мӢң м—¬м„ұ н•ҙл°© мҡҙлҸҷкіј м Ҳл¬ҳн•ҳкІҢ л§һл¬јл ёлӢӨ. лҜёлӢҲмҠӨм»ӨнҠё, Aлқјмқё мӣҗн”јмҠӨ, н”јм—җлҘҙ к°ҖлҘҙлҺ…мқҳ лҜёлһҳмЈјмқҳ лЈ©мқҖ лӘЁл‘җ мқҙ мғҲлЎңмҡҙ мҶҢмһ¬ лҚ•л¶„м—җ к°ҖлҠҘн–ҲлӢӨ. мҡ°мЈјліөм—җм„ң мҳҒк°җмқ„ л°ӣмқҖ л©”нғҲлҰӯ мҶҢмһ¬мқҳ л“ңл ҲмҠӨлҠ” м—¬м„ұл“Өмқҙ “лӮҳлҠ” мқҙм ң л¶ҲнҺён•ң мҪ”лҘҙм…Ӣмқ„ мһ…м§Җ м•Ҡм•„лҸ„ лҗңлӢӨ”кі мҷём№ҳкІҢ л§Ңл“ лҢҖн‘ң м•„мқҙн…ңмқҙм—ҲлӢӨ.
лҚ”л¶Ҳм–ҙ н•©м„ұ 섬мң лҠ” м„ёнғҒмқҙ к°„нҺён–ҲлӢӨ. мқҙлҠ” к°ҖмӮ¬ л…ёлҸҷм—җм„ң м—¬м„ұмқ„ н•ҙл°©мӢңмј°кі , мқҙлҠ” лӢӨмӢң м—¬м„ұмқҳ мӮ¬нҡҢ 진м¶ңмқ„ мҙү진н–ҲлӢӨ. мҳ· н•ң лІҢмқҙ м„ёмғҒмқ„ л°”кҫём—ҲлӢӨлҠ” л§җмқҙ кІ°мҪ” кіјмһҘмқҙ м•„лӢҲлӢӨ.
1970л…„лҢҖ 'л©ҙнҷ”мқҳ л°ҳкІ©', к·ёлҰ¬кі лҚ°лӢҳ
л°ҳл¬ёнҷ”мқҳ мӢңлҢҖ, нһҲн”јл“ӨмқҖ нҷ”н•ҷ 섬мң лҘј ‘мІҙм ңмқҳ мӮ°л¬ј’лЎң ліҙл©° м Җн•ӯн–ҲлӢӨ. к·ёл“ӨмқҖ мһҗм—°мЈјмқҳмҷҖ кіөлҸҷмІҙ, нҸүнҷ”лҘј 추кө¬н•ҳл©° лҰ¬л„Ё, л©ҙ, л§Ҳ л“ұ мІңм—° 섬мң лҘј м• мҡ©н–ҲлӢӨ. нқҷлғ„мғҲ лӮҳлҠ” нҢЁм…ҳмқҖ лӢЁмҲңнһҲ нҠёл Ңл“ңк°Җ м•„лӢҲлқј, мІ н•ҷмқҙм—ҲлӢӨ.
к·ёлҰ¬кі мқҙ мӢңкё°, к°ҖмһҘ нҳҒлӘ…м Ғмқё 섬мң м•„мқҙн…ңмқҙ л“ұмһҘн•ңлӢӨ. л°”лЎң лҚ°лӢҳ. мӣҗлһҳ кҙ‘л¶ҖмҷҖ лҶҚл¶Җл“Өмқҳ мһ‘м—…ліөмқҙлҚҳ мІӯл°”м§ҖлҠ” 70л…„лҢҖм—җ мқҙлҘҙлҹ¬ мІӯм¶ҳмқҳ мғҒ징мңјлЎң кұ°л“ӯлӮңлӢӨ. лҰ¬л°”мқҙмҠӨ501мқҖ л°ҳн•ӯмқҳ м•„мқҙмҪҳмқҙ лҗҳм—Ҳкі , м§ҖлҜё н—Ёл“ңлҰӯмҠӨлӮҳ м ңлӢҲмҠӨ мЎ°н”ҢлҰ° к°ҷмқҖ лЎқ мҠӨнғҖл“ӨмқҖ м°ўм–ҙ진 лҚ°лӢҳм—җ кҪғл¬ҙлҠ¬ нҢЁм№ҳлҘј л¶ҷмқҙкі л¬ҙлҢҖлҘј нңҳм Җм—ҲлӢӨ.
мһ¬лҜёмһҲлҠ” мӮ¬мӢӨ н•ҳлӮҳ. 70л…„лҢҖм—җ л“Өм–ҙ лҜёкөӯ лҶҚл¬ҙл¶ҖлҠ” ‘л©ҙнҷ” мӮ°м—… ліҙнҳё м •мұ…’мқ„ нҺјм№ҳл©° нҷ”н•ҷ 섬мң м—җ л°Җл ӨлӮң л©ҙнҷ”мқҳ л¶Җнҷңмқ„ 추진н–ҲлӢӨ. м •л¶Җк°Җ ‘섬мң л§ҲмјҖнҢ…’мқ„ н•ң м…ҲмқҙлӢӨ. ‘мІңм—° 섬мң к°Җ лҚ” мңӨлҰ¬м Ғ’мқҙлқјлҠ” кҙҖл…җмқҳ мӢңмһ‘мқҙм—ҲлӢӨ.
1980л…„лҢҖ мҠӨнҢҗлҚұмҠӨ, к·ёлҰ¬кі лӘёмқҳ н•ҙл°©
1980л…„лҢҖм—җлҠ” м—җм–ҙлЎңл№…кіј н”јнҠёлӢҲмҠӨ л¶җмқҙ мқјл©ҙм„ң ‘лӘёмқ„ л“ңлҹ¬лӮҙлҠ” мҳ·’мқҙ мЈјлҘҳлЎң л– мҳӨлҘёлӢӨ. мқҙ мӢңкё°лҘј лҢҖн‘ңн•ҳлҠ” мӣҗлӢЁмқҖ лӢЁм—°мҪ” ‘мҠӨнҢҗлҚұмҠӨ’лӢӨ. кі л¬ҙмІҳлҹј лҠҳм–ҙлӮҳлҠ” мқҙ мӢ мҶҢмһ¬лҠ” мҡҙлҸҷліө, л Ҳк№…мҠӨ, л°”л””мҲҳнҠё л“ұмқ„ к°ҖлҠҘн•ҳкІҢ л§Ңл“Өм—ҲлӢӨ.
л§ҲлҸҲлӮҳмҷҖ м ңмқё нҸ°лӢӨ, к·ёлҰ¬кі мӢӨ비아 нҒ¬лҰ¬мҠӨн…”мқҙ мһ…м—ҲлҚҳ лқјн…ҚмҠӨ к°ҷмқҖ мҳ·л“ӨмқҖ ‘м„№мӢңн•Ё’мқ„ л„ҳм–ҙ‘ м—¬м„ұмқҳ мЈјмІҙм„ұ’мқ„ мғҒ징н–ҲлӢӨ. ліҙл””мҪҳ л“ңл ҲмҠӨлҸ„ мҠӨнҢҗлҚұмҠӨмқҳ мӮ°л¬јмқҙлӢӨ. мқҙл•Ңл¶Җн„° ‘лӘёл§ӨлҘј л“ңлҹ¬лӮҙлҠ” кІғ’мқҙ к¶Ңл Ҙмқҳ н‘ңмӢңк°Җ лҗҳм—Ҳкі , мқҙлҠ” лӮҳмӨ‘м—җ мҠҲнҚјлӘЁлҚё мӢңлҢҖмҷҖ м—°кІ°лҗңлӢӨ.
нҠ№нһҲ мқјліёкіј мқҙнғҲлҰ¬м•„м—җм„ң к°ңл°ңлҗң мҠӨнҢҗ мӣҗлӢЁмқҖ мўӢмқҖ н’Ҳм§Ҳкіј м„ёл Ёлҗң к°җм„ұмңјлЎң кі кёү л””мһҗмқҙл„Ҳ лёҢлһңл“ңм—җм„ңлҸ„ к°Ғкҙ‘мқ„ л°ӣкё° мӢңмһ‘н–Ҳкі , кё°лҠҘм„ұмқҙ кі§ лҜён•ҷмқҙ лҗҳлҠ” кі„кё°к°Җ лҗҳм—ҲлӢӨ.
1990л…„лҢҖ мҠӨнҠёлҰ¬нҠё нҢЁм…ҳкіј ‘нҳјн•© 섬мң ’
90л…„лҢҖлҠ” мһҘлҘҙ мңөн•©мқҳ мӢңлҢҖмҳҖлӢӨ. к·ёл§ҢнҒј мӣҗлӢЁлҸ„ лӢӨм–‘нҷ”лҗҗлӢӨ. л©ҙ+нҸҙлҰ¬м—җмҠӨн„°, мҡё+лӮҳмқјлЎ , мҠӨнҢҗлҚұмҠӨ+л©ҙ л“ұ ‘лҜ№мҠӨ 섬мң ’к°Җ ліёкІ©м ҒмңјлЎң нҢЁм…ҳмқҳ м „л©ҙм—җ л“ұмһҘн•ҳлҠ”лҚ°, нһҷн•©кіј мҠӨмјҖмқҙнҠёліҙл“ң л¬ёнҷ”, к·ёлҰ¬кі лӮҳмқҙнӮӨлӮҳ м•„л””лӢӨмҠӨмқҳ мҠӨнҸ¬мё мӣЁм–ҙк°Җ мҠӨнҠёлҰ¬нҠё нҢЁм…ҳмңјлЎң нқЎмҲҳлҗҳл©ҙм„ң кё°лҠҘм„ұкіј мҠӨнғҖмқјмқ„ лҸҷмӢңм—җ мһЎм•„м•ј н–Ҳкё° л•Ңл¬ёмқҙлӢӨ.
мқҙ мӢңлҢҖлҘј мғҒ징н•ҳлҠ” 섬мң лҠ” 'кі м–ҙн…ҚмҠӨ(GORE-TEX)'лӢӨ. л°©мҲҳм„ұкіј нҲ¬мҠөм„ұмқ„ лӘЁл‘җ к°–м¶ҳ мқҙ мҶҢмһ¬лҠ” мӣҗлһҳ кө°лҢҖмҡ©мқҙм—Ҳм§Җл§Ң, м•„мӣғлҸ„м–ҙ л¶җкіј н•Ёк»ҳ мҠӨнҠёлҰ¬нҠёлЎң нқҳлҹ¬ л“Өм–ҙмҷ”лӢӨ. л…ёмҠӨнҺҳмқҙмҠӨ, нҢҢнғҖкі лӢҲм•„, к·ёлҰ¬кі мҠҲн”„лҰјк№Ңм§Җ мҶҢмһ¬к°Җ кі§ мӢ 분мқҙ лҗҳлҚҳ мӢңм ҲмқҙлӢӨ.
лҳҗ 90л…„лҢҖлҠ” 'лҰ¬мӮ¬мқҙнҒҙ 섬мң 'лқјлҠ” к°ңл…җмқҙ мІҳмқҢ лҸ„мһ…лҗң мӢңкё°мқҙкё°лҸ„ н•ҳлӢӨ. м§ҖмҶҚ к°ҖлҠҘм„ұкіј нҷҳкІҪм—җ лҢҖн•ң кі лҜјмқҙ мӣҗлӢЁ м„ нғқм—җк№Ңм§Җ л°ҳмҳҒлҗҳкё° мӢңмһ‘н•ң кІғмқҙлӢӨ.
мҡ°лҰ¬лҠ” нқ”нһҲ нҢЁм…ҳмқ„ л””мһҗмқҙл„Ҳмқҳ м•„мқҙл””м–ҙлӮҳ мң н–үмқҳ нқҗлҰ„мңјлЎң мқҙн•ҙн•ңлӢӨ. к·ёлҹ¬лӮҳ к·ё мқҙл©ҙм—җлҠ” м–ём ңлӮҳ ‘кё°мҲ кіј мҶҢмһ¬мқҳ 진нҷ”’к°Җ мһҲм—ҲлӢӨ. нҢЁм…ҳмқҖ л§җн•ҳмһҗл©ҙ 섬мң кіөн•ҷмқҳ мәЈ мӣҢнҒ¬лӢӨ. 섬мң к°Җ ліҖн•ҳл©ҙ мҳ·мқҙ ліҖн•ҳкі , мҳ·мқҙ ліҖн•ҳл©ҙ мӮ¬лһҢмқҳ мӣҖм§Ғмһ„мқҙ лӢ¬лқјм§„лӢӨ. к·ёлҰ¬кі к·ё ліҖнҷ”лҠ” кі§ мӮ¬нҡҢлҘј л°”кҫјлӢӨ.
60~90л…„лҢҖмқҳ нҢЁм…ҳмқҖ лӢЁмҲңн•ң мҠӨнғҖмқјмқҙ м•„лӢҲлқј, мӣҗлӢЁмқҙ лІҢмқё нҳҒлӘ…мқҳ кё°лЎқмқҙлӢӨ. мӢңлҢҖлҘј мғҒ징н•ҳлҠ” к·ё мҲҳл§ҺмқҖ лЈ©л“ӨмқҖ, мӮ¬мӢӨ 'мӢӨ н•ң к°ҖлӢҘ'м—җм„ң мӢңмһ‘лҗҳм—ҲлӢӨ.
 |
| мҳӨ진нғқ м—җмқҙм— лһ© лҢҖн‘ң |
< м Җмһ‘к¶Ңмһҗ в“’ м–ҙнҢЁлҹҙлүҙмҠӨ, л¬ҙлӢЁм „мһ¬ л°Ҹ мһ¬л°°нҸ¬ кёҲм§Җ >








.jpg)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