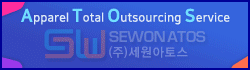DBR 4월(No. 391)호를 보다가 ‘아프니까 중간관리자’라는 표현을 보게 되었다. 왠지 알 수 없는 짠함이 느껴지면서 몇 년 전 면담을 한 팀장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팀의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팀장을 처음 해보는 본인 때문에 자신의 팀 성과가 낮은 것이라면서 한숨지었다. 그 한숨에 중간 관리자로서의 고충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 마음으로 공감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사실 중소기업 팀장은 연차가 차면 자연히 하게 되는 직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처럼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직무와 직책에 따른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팀장 본인의 능력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팀장의 자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다. 위로는 꼰대 상사가, 아래로는 MZ 부하직원 사이에 어느 날 떨어지는 것이다.
사실 팀장 아래 직원들은 자신의 팀장을 보면서 막연히 팀장이라는 직책이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하지만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모든 것이 다르다. 모두에게 호인이라고 불리던 상사의 목소리는 나에게만 가시 돋쳐 있고, 술 한 잔과 함께 애환을 나누던 후배는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며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니 팀장이 눈칫밥만 늘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어진 성과를 내기도 바쁜데 팀원의 이탈 방지를 위한 면담과 새로운 인력관리 트렌드까지 섭렵하고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조직의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조직관리 측면에서 중간관리자인 팀장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가장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조직의 ‘심리적 안전감’을 강조하던 시기에는 장기 근속한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비중을 높게 두었다면 코로나 시기에는 원격 근무와 개인별 업무 분담이 강해지면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불리던 호칭을 ‘○○님’, ‘○○프로’ 또는 영문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세이다. 하지만 호칭과 직급 체계 변경만으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차가 10년 이상 차이 나는 상사에게 ‘○○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나 여간 어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호칭을 부르지 않거나 사내 메신저로만 소통하게 되어 친밀감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수직적으로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평적 호칭을 도입했지만 구성원의 저조한 참여와 뿌리 깊은 위계질서 문화를 없애기는 힘들어 보인다. 업계에서 성공적인 수평적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12월 김범수 위원장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영어 이름 사용, 정보 공유와 수평 문화 등까지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후 카카오 게임부터 영어 호칭을 한국 본명에 ‘님’을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직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직위와 직책의 구분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네이버도 2017년 폐지했던 임원 직급을 2019년 ‘책임 리더’라는 명칭으로 부활시켰다. 각 조직의 권한 및 책임의 분산과 관련해 누가 수장인지 인식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목표와 성과를 책임질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과제 앞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눈치 보느라 번아웃이 되고 있는 팀장들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나도 처음 하는 팀장이 제일 어려웠어. 그때의 나에 비하면 팀장님은 정말 잘하고 있어.’
 |
| 유미애 세원아토스 부사장 |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