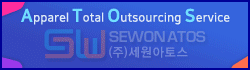최석근의 ‘디지로그 2.0’
디지털만의 시대는 갔다. 디지로그2.0 시대가 왔다.
기술로 달리는 속도보다 브랜드의 본질(아날로그)과 고객 중심 실행(디지털)의 ‘균형’이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조직이 ‘시스템만 도입하면’ 문제가 풀릴 거라 믿는다. 현실은 정반대다. 기술을 깔아도 업무 방식이 거의 변하지 않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미한 이유, 바로 디지털 전환을 ‘기술 교체’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전환의 출발점은 언제나 사람, 전략, 프로세스, 문화에 있다.
시스템은 번쩍이는데 MD와 DS의 엑셀 업무, 기상 변수 대응, 고객 언어 반영에는 변화가 없다. 문제는 입틀막이다.
‘맥킨지 글로벌 서베이 2025’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AI 프로젝트의 76%가 파일럿 단계에서 끝난다고 한다. 글로벌 사례 뿐 아니라 국내 패션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동일 현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과거 진행했던 수십억, 수백억 프로젝트들의 성공과 실패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 패션 DX가 유독 어려운 실제 이유와 해법을 알아보자.
첫째, ‘기술 우선’의 착시다. DX를 프로젝트로만 다루면 본질을 놓친다. 어떤 솔루션을 살지보다 왜, 어떻게, 누가 쓸지가 핵심이다. 성공한 기업은 공통적으로 사람에 먼저 투자하고, 데이터 리터러시와 현업 리더를 체계적으로 키워 일의 방식 자체를 바꾼다. 기술은 수단이고, 전환의 중심은 사람이다. 디지로그 2.0 관점에서 브랜드의 맥락을 해석하고 고객 언어로 실행할 수 있는 인재와 문화가 없으면, 어떤 스팩도 장식품이 된다.
실례로 AI가 이미지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완성형으로 나왔던 이미지 분석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다. 도입 후 한 달도 안돼 C레벨은 업무 자동화의 생산성을 기대했지만, 현업은 해당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공감조차 없었다. 당연히 해당 솔루션은 1년을 넘기지 못했다. 기술 전환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과 전략이다.
둘째, ‘빅뱅 도입’의 덫이다. 패션 회사는 시즌, 주차, 드롭, 캠페인 등의 프로세스가 빠른 호흡으로 움직인다. 처음부터 전사를 뒤집는‘빅뱅’은 실패 확률만 높인다. 현업 담당자의 작은 업무 프로세스, 역할별 워크플로우에서 실무 파일럿으로 시작해야 한다.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며, 구성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리스크를 통제하고, 내부 성공 경험을 축적해야 현장발 개선 아이디어가 솟아난다.
과거 IT 인프라 초기 단계에서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 같은 무거운 전사 시스템은 빅뱅 도입이 정답이었다. 지금은 속도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뀌어 작고 가벼우며 빠른 것이 무조건 정답인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생성 AI가 이를 더욱 부추기는 오늘날, 중요한 건 완벽한 설계가 아닌 빠른 실행과 실제 경험에서 배우는 학습의 루프다. 작게 시작해 빨리 검증하고 학습하라. 작고 빠른 실패가 프로젝트 성공의 나침반이다.
▶다음 칼럼에 계속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