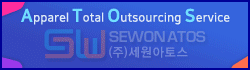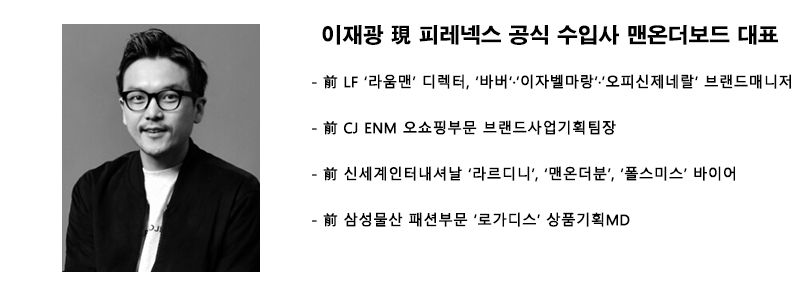이재광의 ‘인생이 패션’
올 상반기 들어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을 기사와 업계 동향을 통해 접하고 있는 중이다. 생각해 보면 필자 역시 올해 들어 어떤 아이템을 특별히 구매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편이다. 지난해에 비해 그렇다는 말이다.
그 와중에 MZ들 사이에는 소비를 절제하는 저소비 코어(Underconsumption Core)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연해 왔던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피로감의 풍선효과로 발현된 현상일 수 있겠다. “#광고”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시작하는, 진심보다는 자본의 힘이 담겨져 있는 포스팅들이 주변에서 쉽게, 아주 자주 보여지다 보면 피로도가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흐름의 현상은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필자의 생각을 담은 원인을 찾아보았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다.
먼저, 환경과 구매 명분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다. SPA와 소비지향형 자본주의가 부추겨 온 과다 생산 체제는 결국 과다 재고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매체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최대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아울러 패션 산업은 대체로 노동집약적 성향을 띄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생산 비중이 높고, 제품 생산에 투여되는 에너지가 대부분 화석연료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필자 역시 구매 후 태그도 떼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헌 옷 수거함에 버렸던 경험이 너무나도 많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고, 이제는 한 벌을 구매하더라도 똘똘한 아이템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현상의 첫 번째 발현이 바로 빈티지 아이템과 마켓, 그리고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리셀, 리유즈 마켓이다.
두 번째 원인은 경제적 결핍이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 사망자 수가 늘고, 고통스러운 자가격리 기간을 지나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 기간 갈 곳을 잃은 대규모 자본 또는 비교적 더 쌓인 통장 잔고는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부터 보복 투자 또는 보복 소비로 이어졌다. 많은 브랜드들이 투자를 받아서 IPO를 향해 달려가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우리들 역시 밖에 다시금 나갈 수 있게 됨으로써 여러 패션 아이템을 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나 보다. 과다하게 풀린 자본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투자가 위축되며, 대량 해고 또는 대대적 비용 감축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를 지나고 이제 패션 소비 세대로 부상한 MZ들은 지갑이 이미 얇아졌고, 브랜드들 역시 몇 년 전에 비해 힘이 많이 빠진, 혹은 옥석이 가려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소비에 대한 욕구가 분명 자리 잡고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딱히 사고 싶은 아이템이 없거나, 여유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영국에는 ‘Old wine in new bottles’라는 표현이 있다.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내용물은 그대로라는 뜻으로, 변화가 일어나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이다. 필자의 기존 칼럼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소비 행태가 패션에서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는 게 현 트렌드라 하더라도 무언가를 소비하는 행태는 지속될 것이다. 지구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더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기존에 지니고 있는 아이템들만을 사용하는 것이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비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패션 산업에 몸 담고 있는 나는 어떠해야 할까. 오래도록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진정성을 담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일 것이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