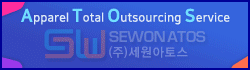고태용의 ‘패션 디자이너의 세계’
최근 우리는 누구나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뮤지션, 배우, 최근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까지 그 범위에 포함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적 과정을 소위 아웃소싱이나 전문화된 직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브랜드의 오너는 ‘디자이너‘라는 호칭보다는 ‘디렉터‘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역량있는 디렉터들은 좋은 팀원들 혹은 전문가들과 함께, 때로는 기존의 패션 브랜드와는 다른 방식으로 브랜드를 전개하며 오히려 새로운 결과물들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또 사랑받는 브랜드가 된다.
하지만 이런 ‘디렉터‘라는 단어가 일부 브랜드의 오너들을 통해 남용되며 최근 국내에 일어난 수많은 논란들 속에서 소비자들은 피로도를 느끼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오히려 패션을 가볍게 즐기던 젊은 소비층들조차 브랜드가 전달하는 패션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디렉터 역량의 중요성을 최근 외치고 있다.
이에 많은 브랜드와 디렉터들은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의 컨텐츠 형식으로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아이덴티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어느 순간 패션이 본질보다 보여지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되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도 20대 시절 패션의 화려한 면에 이끌려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벌써 20년 가까이 배움의 자세로 이 직업을 마주하고 있다. 보여지는 것에 매료되어 시작된 일이지만, 오랜 시간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브랜드의 가치와 좋은 취향을 전달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었다.
최근 대학교의 패션 관련 학과들은 축소되거나, 뷰티 등 다른 학과와 통합되는가 하면 심한 경우 학과가 없어지기도 한다.
젊은 디렉터들은 학교의 커리큘럼보다 실무 경험을 선택하거나 유튜브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패션이라는 직업을 경험하며 학교에서의 배움을 대안으로 삼는다고 한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패션이라고 하는 직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것을 재창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학교 시절 관심 없던 복식사 수업을 디자이너가 되고 난 후 다시 연구하게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과거의 것을 연구하고 새롭게 창조해야 하며 또 다양한 것을 흡수하고, 좋은 양분으로 바꿔 소비자들에게 좋은 옷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 '디렉터'의 역할이다.
그런데, 본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없이, 요즘 통한다는 ‘방식’에만 능통해서는 소비자들과 오래 호흡하는 브랜드를 만들기 힘들다.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특정된 영역의 기술자를 말하지만, 디렉터는 디자인부터 디렉팅까지, 제품부터 메시지까지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재미는 물론, 지금 사람들이 패션을 통해 구현하려는 욕구, 자신의 브랜드가 위치할 포지션, 그것을 옷이라는 피지컬로 표현하는 기술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디렉터의 시대가 됐다는 것은 다름 아닌 브랜딩의 시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트렌드를 유통시키는 일이 패션이 되던 시대에는 디렉터가 주인공일 수 없었다. 진짜 디렉터들의 진검승부를 기대한다.
 |
| 고태용 비욘드클로젯 대표 |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