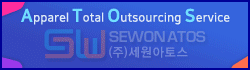고태용의 ‘패션 디자이너의 세계’
요즘 패션은 말 그대로 ‘불꽃놀이’같다. 짧게 타오르고 빠르게 사라진다. 한 시즌을 휩쓸던 트렌드가 채 무르익기도 전에 사라지고, ‘라부부’같은 유행템 뿐 아니라, ‘올드머니’, ‘코어’라는 이름을 단 스타일들이 하루가 멀게 피었다 진다. 사람들은 유행을 쫓기 위해 SNS 알고리즘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타일을 바꾼다. 하지만 그 안에서 소비자들은 묻는다. “이런 패션, 우리가 왜 계속 따라가야 하지?”
패션은 원래 반복되고 진화하는 문화였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은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다. 지속 가능성은 물론, 정체성과 방향성까지 희미해질 정도다. 트렌드는 더 이상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견디는 것’이 되었다. 사람들은 유행을 소비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피로를 느낀다. 유행을 놓치면 뒤처지는 기분, 그러나 따라가자니 지치고 허무한 감정. 이 과잉 소비의 정서 속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는 과연 어떤 존재여야 할까?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생태계 안에서 도덕적,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브랜드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노동 착취, 저작권 침해, 젠더 감수성 결여, 환경 파괴 등등. 멋을 소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의 뒤에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 몇몇 브랜드는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이나, 온라인 바이럴을 통해 몸집을 키우다, 디자인 표절이나 윤리적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곤두박질쳤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단순한 구매자를 넘어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참여자’로 변하고 있다. “이 브랜드는 과연 내 가치와 맞는가?”라는 질문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다.
그런 흐름의 반대편에서는 놀랍게도 ‘빈티지‘와 ‘클래식‘에 집중하는 브랜드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유행 대신, 시간을 견디며 살아남은 실루엣과 소재,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이 브랜드들은 빠른 소비보다 ‘깊은 소비’를 원하는 젊은 세대에게 오히려 신뢰와 매력을 준다. 오래된 청바지, 클래식한 재킷, 구식 재봉 방식 등. 겉보기에 낡아 보일 수도 있는 이 요소들이 지금은 ‘새로움’이 되었다. 소비자들 또한 단순히 멋을 넘어, “내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분석하는 수고로움마저 외면하게 된 소비자들의 태도다.
어느 순간부터 소비자들은 직접 검색하고 비교하며 패션을 ‘즐기는’ 대신, 유튜브 속 쇼핑 추천 콘텐츠나 리뷰 영상에 맹목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다. 물론 영상 콘텐츠는 빠르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편리함은 곧 비전문적이고 상업적인 정보에 대한 ‘무비판적 신뢰’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소비는 결국 후회로 귀결된다. ‘이걸 왜 샀지?‘, ‘막상 입어보니 나와는 안 어울려‘ 같은 자각이 쌓이고, 반복된다. 결국 소비자는 피로감을 넘어 회의감까지 느끼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사는 소비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지금, 소비자에게는 다시금 주체적인 취향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는 분명하다. 단순히 트렌드에 맞춰 반짝하고 사라지는 브랜드가 아닌,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브랜드, 그리고 무엇보다 윤리적 책임과 철학을 가진 브랜드다.
어차피 살아남을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 말은 패션에도 유효하다. 이 치열하고 피로한 유행 속에서도, 자기만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는 브랜드와 디자이너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결국 패션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
| 고태용 비욘드클로젯 대표 |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