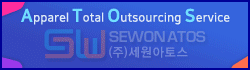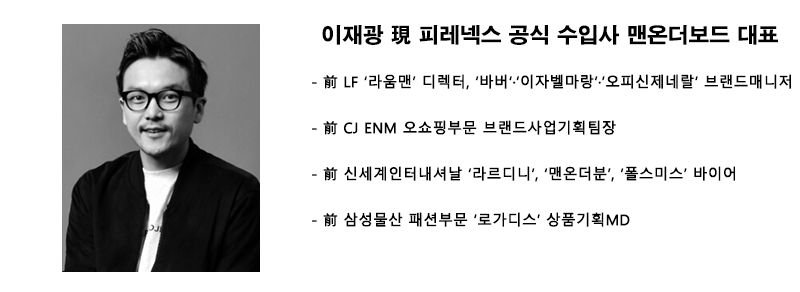이재광의 ‘인생이 패션’
 |
| 쉬인 |
한동안 유통·패션 업계의 화두는 ‘지속가능성’이었다. 그러나 2~3년부터 이어진 물가 상승과 생활비 압박은 소비자의 시선을 다시 가격으로 끌어당겼다.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트레이드 다운(trade-down), 즉 더 저렴한 채널·상품으로의 이동이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리테일 PB는 구조적 혜택을 받고 있다. 맥킨지는 미국 소비자의 약 75%, 유럽의 85%가 ‘가격을 낮추는’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중 4분의 1은 PB로의 전환이라고 진단한다. 유럽 식품점 시장을 보면 2024년에도 거래량이 둔화된 가운데 소비자의 상·하향 이동이 동시에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다운그레이드가 균형을 맞춘 한 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환경에서 쉬인(Shein)의 프랑스 상륙은 상징적이다. 파리는 쉬인의 첫 상설 매장을 준비했고, 백화점 파트너십을 둘러싸고 업계 반발과 시민 청원, 규제기관의 압박이 잇따랐다.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불법 상품 문제를 이유로 접속 차단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2025년 한 해 동안 쉬인에 부과된 벌금 총액은 1억9,100만 유로에 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럼에도 쇼핑객은 몰렸고, 오프라인 확장 계획은 ‘가격 메리트’에 힘입어 계속 검토되는 중이다. 즉, 윤리·환경 논쟁과 별개로 ‘싼값의 흡인력’이 강력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미국에선 코스트코의 PB ‘커클랜드 시그니처’가 저가·가성비 소비의 표준이 되고 있다. 현재 ‘커클랜드’는 연간 약 860억 달러 매출, 코스트코 매출의 약 3분의 1 비중으로 평가된다. 코스트코 전체 매출은 2025 회계연도 기준 2,699억 달러(+8.1%)로 증가했고, 경영진은 갱신율 90% 안팎의 멤버십 충성도와 함께 PB 침투율의 추가 상승을 강조한다. 커클랜드의 구조는 단순하다. SKU를 좁히고, 대량으로, 낮은 마진으로, 브랜드 급 품질을 ‘상시 저가’로 반복 제공하는 것. 이 방식은 인플레 국면에서 소비자 스트레스의 직접 해소책이 됐다.
숫자는 더 광범위한 변화를 보여준다. 미국 PB 매출은 전년 대비 4%대 성장으로 내셔널 브랜드를 앞질렀고, 소매 채널 중에서도 클럽·메스 채널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PB=저가 대체재’라는 낡은 인식은 무너지고, ‘첫 선택지(First Choice)’로 자리 잡는 항목이 늘고 있다. 이는 ‘친환경적 소비’의 선호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지갑이 먼저 반응한다는 뜻이다. 소비자는 의미를 원하지만, 의미에는 ‘적정 가격’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어야 할까? 필자는 두 갈래 중 하나가 아니라 ‘이중 트랙’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결론 ‘그린 앳 더 라이트 프라이스(Green at the right price)’. 브랜드는 지속가능성 스토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공급망·소싱·포장·유통비 등 원가 구조에서 PB식의 효율을 이식해, 친환경 옵션도 상시 합리덧 가격으로 가져와야 한다. ‘정가-프로모션’의 마케팅 관성에서 벗어나 항구적 저가(EDLP)형 구조를 설계하고, 그 절감분을 친환경 소재·리페어/리세일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의 양심과 예산은 동시에 만족 될 수 있다.
두 번째 결론 ‘밸류 바(Bar) 재설계’. 한 라인업 안에 ‘굿-베러-베스트(GBB)’를 명확히 쌓되, ‘굿’ 구간을 PB 수준의 품질/가격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대다수 가구의 월간 지출은 고정비(주거·교육·식료) 상승으로 타이트해진 상태다. 이때 브랜드가 할 일은 한 품목의 프리미엄을 고집하기보다, 장바구니 전체 최적화를 돕는 가격 설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는 저가형 소비를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으로 인식할 수 있다.
결국 ‘친환경이냐, 저가냐’는 제로섬이 아니다. 프랑스에서의 쉬인 논란과 미국의 커클랜드 질주는 윤리·환경과 생활비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이 간극을 메우는 브랜드가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의미의 언어로 설득하고, 가격의 언어로 안심시키는 것. 두 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기업만이 팬과 매출을 함께 얻는다.
워런 버핏의 말을 빌려 마무리하고자 한다.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가격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가치의 정의에 ‘지속 가능’과 ‘생활비 안심’을 함께 넣는 일이다. 소비자는 그 균형을 가장 먼저 알아본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