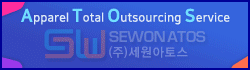최석근의 ‘디지로그 2.0’
2025년은 패션 산업에 있어 AI와 디지털 기술이 더 이상 실험이나 유행어가 아닌, 비즈니스의 전제가 된 해였다. 기획과 디자인, 생산과 유통, 마케팅과 고객 분석에 이르기까지 AI는 패션 비즈니스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많은 기업이 이를 통해 속도와 효율, 확장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AI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반복 업무를 줄이며,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해왔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패션 산업의 현장을 다시 들여다보면 기술의 진보와는 다른 차원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제조 기반과 창업 생태계는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필자가 방문한 서울의 한 패션 제조 지원센터는 이러한 현실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자동 재단기와 샘플실, 교육 공간과 촬영 스튜디오까지 갖춘 이곳은 단순한 지원 시설이 아니라, 패션 산업의 아날로그적 본질이 여전히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현장이었다.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던 메시지는 분명했다. ‘패션은 여전히 사람이 만들고, 몸이 입으며, 손의 감각을 통해 완성되는 산업’이라는 사실이다. 디자이너가 제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브랜드를 시작할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브랜드는 최소 3~4년 이상의 반복적인 상품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다. 자동 재단기와 디지털 장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제조가 자동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계를 운용하고, 패턴의 적합성을 판단하며, 원단과 봉제의 미묘한 차이를 읽어내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특히 상품화 수준의 완성도를 가르는 판단은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패션 산업의 아날로그 영역은 대체의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과 함께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핵심 기반 임이 분명해진다.
AI 역시 마찬가지다. AI는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판단을 가능하게 하지만, 판단 그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추천과 예측, 시뮬레이션은 수행할 수 있으나, 그 결과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다. 패션 산업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더욱 명확하다. 데이터는 과거의 패턴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소재의 촉감이나 착용 시의 불편함, 미묘한 실루엣의 차이와 같은 요소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결국 AI는 디자이너, MD, 생산 담당자의 경험 위에서만 의미 있는 도구로 작동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단순한 공존이 아니다. 핵심은 오케스트레이션이다. 디지털은 속도와 확장을 담당하고, 아날로그는 판단과 완성도를 책임진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디지털 촬영과 온라인 유통,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확장되며,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하지 않는다.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시너지가 발생한다.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패션 산업이 준비해야 할 변화의 방향은 명확하다. 더 많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AI 기술로 무엇을 자동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기술로 현장의 판단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프라인 제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디지털 전환은 공허해지기 쉽고, 사람의 경험을 배제한 AI 활용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패션 경쟁력은 기술 도입의 속도가 아니라, 디지로그적 균형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손으로 만들고, 몸으로 입고, 데이터로 확장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브랜드만이 다음 시대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