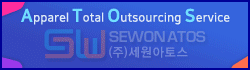이재경의 ‘패션法(법) 이야기‘
 |
| 듀프 문화로 떠오른 월마트 ‘워킨백‘(왼쪽)과 에르메스 ‘버킨백‘(오른쪽) |
짝퉁도 아니고, 택갈이 제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품은 더더욱이 아니고.
‘듀프(dupe)‘라고 불리우는 정체불명의 제품들이 세계 패션계를 강타하고 있다. 유행이라 하지만, 뭔가 찜찜하다. 도대체 듀프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는가. 화가 고갱이나 고객에게 물어봐야 하나?
듀프라는 단어는 ‘복제(duplication)’에서 비롯되었다. 로고를 베끼거나 거의 그대로 모방한 불법 복제와 달리, 기존 오리지널 제품의 느낌은 살리되, 상당한 부분을 변형한다. 고가로 책정된 명품 브랜드를 대신하여 명품의 느낌이 깃든 대안 제품을 찾는 ‘듀프 소비’ 열풍은 시대적 운명인지도 모른다. 고물가 시대에 럭셔리 소비는 둔화되는 반면, 가성비로 승부하는 SPA는 듀프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MZ세대의 마음은 단순히 가성비에만 있지 않다. 듀프의 공개 소비를 오히려 힙(hip)하게 느낀다. 듀프는 가성비와 힙한 만족감이 높으므로 MZ를 겨냥한 소셜미디어에서 듀프 광고가 넘쳐난다. ‘명품스러운 색깔, 디자인에 가격은 1/20!’이라는 호객 문구에 끌린다. 월마트가 판매하는 버킨백 듀프는 그렇게 태어났다.
유니클로는 가장 발 빠르게 듀프 소비에 올라탔다. 크리스토퍼 르메르, JW앤더슨, 질샌더, 마르니 같은 명품 브랜드와 협업으로 한정판 듀프 제품을 내놓아 오픈런 완판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시 출신 패션 디자이너 클레어 웨이트와의 콜라보 브랜드 ‘UNIQLO:C‘까지 이어지고 있다. SPA 자라(ZARA)도 듀프 열풍에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무척 짧은 ‘매장 전시 주기’를 통하여 듀프의 소비 사이클을 더 빠르게 돌릴 수 있었다. MZ들은 이런 듀프 제품에 대해 브랜드 뒤에 '~맛', ‘느낌’ 등의 접두어를 붙인다 ‘질샌더맛 유니클로‘, ‘프라다 느낌 신발’ 같은 애칭이 SNS의 입소문을 통하여 듀프의 고공 매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들은 죽을 맛이다. 루이비통, 지방시, 디올 등 휘황찬란한 브랜드를 거느린 LVMH의 호시절도 지나간 모양이다. 하늘도 뚫고 오르던 성장세가 2024년부터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구찌, 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등의 케어링 그룹은 2024년 실적이 1/2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최근 10년 사이에 최악을 기록했다. 레깅스 계의 샤넬로 불리우는 룰루레몬도 주춤하고 있다. 룰루레몬의 듀프 브랜드인 짐샤크, 에이와이비엘이 내놓는 레깅스 가격이 3만 원이다 보니 손님을 다 뺏기고 있다. 모두 듀프 소비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그러나 듀프 현상을 법의 프리즘에 투영해놓고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냥 마음이 편하지 않다. 듀프는 짝퉁이 아니므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의 허락을 받은 콜라보가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여지는 남아있다.
제품의 개발 과정 및 브랜드 구축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명품 브랜드 제품이 보호받는 최후의 보루가 부정경쟁방지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동법 제2조제1호(카)목의 구체적 기준에 의하면, ‘침해자의 상품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듀프에 의하여 명품 브랜드가 대체되고, 혼동될 수도 있어 럭셔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면 듀프의 적법성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의 취향, 선택이 그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시인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는 남고”라고 외쳤다. 고물가 시대에는 과연 누가 껍데기인가? 가성비와 ‘힙’함을 중시하는 MZ에게는 듀프가 오히려 ‘알맹이’인지도 모른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