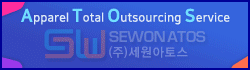박현준의 ‘스타트업의 세계’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엔젤 투자자로서 본인은 2개의 음식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 하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유주방’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스타트업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1인용 피자를 타겟팅한 스타트업이었다.
두 곳 모두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생경한 분야여서, 투자자인 나는 F&B 관련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엔젤 투자자였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푸드테크(Food+Technology 합성어) 스타트업을 창업한 창업자들이 자주 투자 검토를 요청해왔고, 기존의 ‘맛집’ 확장을 위해 투자유치를 시도하고 있는 운영주들, 그리고 음식배달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소개를 받아 투자 검토를, 하고 조언을 하곤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중 몇몇 사장님들과는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가끔씩 만나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공유하곤 한다. 오늘은 그중 한 곳인 바비큐 음식점의 사장님 이야기를 공유하려 한다.
지금은 신촌으로 회사 사무실을 이전했지만, 2022년 말까지 우리 회사의 사무실은 이태원이었다. 그래서 이태원의 소위 ‘핫플’ 음식점에서 한가한 시간대인 평일 점심때 식도락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다. 지금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물가물해진 기억이 되었지만, 코로나 초창기 가장 직격탄을 맞은 상권이 바로 이태원이다.
갑자기 유령도시처럼 변해버린 그 황량한 이태원의 세계음식거리를 걷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태원의 ‘L’ 바비큐집도 코로나 팬데믹의 대표적인 희생양 중 하나였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거의 매월 매출이 성장해왔고 맛집이자 핫플이었다. 그러다 팬데믹 직후 직격탄을 맞았고, 다급해진 창업자분은 이곳저곳의 소개로 나를 만나게 되었다. 만나고 보니, L 바비큐집의 사장님은 너무나 선량했고, 바비큐라는 요리에 진심인, 미국 남부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그는 만날 때마다 약간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사용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 곳의 음식점에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힘든 점이 있어 내가 투자를 하지는 못했고, 다른 투자자를 찾지도 못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22년 할로윈의 비극을 잘 버텨낸 끝에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부동의 바비큐 맛집으로 생존해오고 있다.
그렇게 친교를 맺은 반가운 창업자를 지난주에 만나 점심을 함께 하다, ‘확장’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갔다. 확장을 고민 중인 창업자에게 최근 음식 및 식료품 배송 관련 대기업의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함께 모처에 있는 대규모 바비큐 제조공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바비큐의 익힘 시간이 너무 짧아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말한 짧은 영어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한참을 맴돌았다. “Barbeque is not a recipe, but a process!”
이 말을 들은 나는 그에게, 당신은 지금 프랜차이즈나 밀키트 상품 개발 등의 확장을 하는 것보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한 곳에 더 집중해서 ‘브랜드’를 더 키우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위 문장의 ‘바비큐’ 자리에 ‘스타트업 투자’가 들어가도, ‘사업’이 들어가도 다 들어맞겠다는 생각을 하며 감탄했다.
그렇다. 바비큐는 조리법이 아니라, 조리과정 그 자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쉐프에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확장이 들어맞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스타트업 투자도 마찬가지다. 본 칼럼의 다른 글들을 통해 몇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스타트업 투자는 투자 후 ‘투자기업에 대한 지난한 관리’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된다.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이든 ‘결과’에만 집착하면 그것을 낳게 되는 ‘과정’을 놓칠 공산이 크다. 오늘도 또 하나의 지혜를, 맛있는 바비큐 점심을 함께 한 친구에게서 배운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